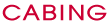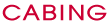22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주민들이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 문구가 적힌 입간판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누크=정승임 특파원
“트럼프 말을 어떻게 믿나? 우리는 여전히 밤잠을 못 잔다.”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불태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 사용’ 카드를 접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수도 누크는 더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그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와 북극에 대한 미래 합의 틀’을
바다이야기사이트 마련하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봉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그건 외부자의 시선이었다. 그린란드 일부의 영토 주권을 미국에 부여하기로 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쏟아지자 현지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
퇴근길에 만난 50대 여성 미리엄 디아스는 “불안하지만 침착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아직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릴짱릴게임 실제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간 합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사자인 그린란드를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진 탓이다.
심상치 않은 기운은 현장에서도 감지됐다. 디아스와 인터뷰 도중 검정 롱패딩을 입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바다이야기릴게임2 따라갔지만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 대신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얼마 전 협조 요청차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했었다.
“덴마크와 미국은 뭐가 다른가”
22
야마토게임 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 공항에 도착한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내려 이동하고 있다. 누크=정승임 특파원
이날 본토라 할 수 있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4시간 50분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누크의 지리적 위치는 묘했다. 덴마크 자치령이지만 코펜하겐에서 직선 거리는 3,520㎞로 미국 뉴욕(2,980㎞)
릴짱릴게임 이 더 가까웠다. 코펜하겐과 시차는 3시간, 화폐는 덴마크 통화 크로네(DKK)를 쓴다. 1979년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후에도 독립을 꿈꿨던 닐센 총리는 13일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령으로 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3자의 입장에서 ‘왜 덴마크는 되고 거리가 더 가까운 미국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300년간 그린란드를 식민 지배했던 덴마크는 원주민을 상대로 강제 불임시술까지 했다. 반대로 강대국인 미국은 한때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1억4,700만 원) 지급을 검토했다.
22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나부끼는 자치 깃발. 누크=정승임 특파원
누크 중심가에서 만난 나얀구약 카르넬리우센(18)은 “과거 역사 때문에 아직도 덴마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트럼프가 지배하면 의료비 폭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세금만 내면 병원 이용이 공짜”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복지국가인 덴마크식 공공 의료 시스템에 따라 진료, 입원, 수술비가 대부분 무료다. 미국령이 돼 미국식 제도를 따르면 폭등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린란드 주민 대다수는 덴마크식 복지 모델과 폭넓은 자치권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라 안드레아센(32)은 “덴마크는 그래도 우리를 존중하지만 트럼프는 광물 등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는 약탈자 이미지가 강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덴마크계 혼혈인이 증가하는 것도 거부감을 줄이는 요소다. 이날 기자가 묵은 호텔 직원인 30대 남성은 “덴마크에 대한 호불호는 반반인 것 같다”며 “나 같은 덴마크계 혼혈인이 늘면서 반감도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자치 깃발' 내걸고 의지 다져
22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한 의류매장에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누크=정승임 특파원
그린란드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건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누크를 방문했을 당시 방심했던 기억 때문이라는 것도 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쓴 일행과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단순한 퍼포먼스라고 여겼던 주민들은 1년 뒤 엄청난 후폭풍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때문일까. 17일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집회였던 일명 ‘반트럼프 시위’에선 미국인을 비하하는 ‘양키 고홈’이라는 과격한 구호까지 나왔다.
이날 현지 상인들은 평소처럼 그린란드 자치 깃발과 ‘Greenland is not for sale(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내걸며 사수 의지를 다졌다. 현지 의류매장 ‘아웃도어 그린란드’ 직원은 ‘가게들이 원래부터 자치 깃발을 내걸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점령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누크(그린란드)=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