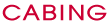프랑스 미국 칠레 등에서 난 다양한 빈티지의 와인들. 천호성 기자
2023년 연말의 저녁, 필자는 서울 한 식당에서 와인 한잔을 두고 고민에 잠겼다. 필자의 와인 ‘스승님’이 블라인드(병을 가린 채 서빙)로 내어준 술의 정체를 맞히기 위해서였다. 수십년 간 와인을 수집해온 전문가인 스승은 필자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방대하고 진귀한 와인 포트폴리오를 가졌다. 블라인드 시음을 출제한 건 이날의 와인이 제자에게 ‘공부’가 될 만하기 때문이리라.
프랑스 보르도의 ‘샤토 레 카름 오브리옹’(Château Les Carmes Haut Brion)에 전시된 오래된 와인들. 이 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토의 와인들 외에도 세계 각지의 올드 빈티지가 보인다. 천호성 기자
레드·로제 구분 어려운 범상치 않은 와인
와인은 잔에 담긴 외관에서부터 범상치 않았다. 마른 낙엽 같은 연갈색을 띠었는데, 잔 너머가 비쳐 보일 정도로 탁도가 낮았다. 그렇게나 ‘투명한’ 레드와인은 처음이었다. 식
신한은행 신용등급무료조회 당의 소믈리에는 초장부터 미궁에 빠진 필자를 보며 농담을 건넸다. “이거 ‘타벨’(Tavel·프랑스의 생산지) 로제네.” 로제와인을 연상시킬 만큼, 레드와인 치고 색이 엷다는 말이었다. 필자는 와인이 레드와인이 맞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로 잔에 코를 대었다.
향은 더욱 생소했다. 설탕을 넣고 달인 대추나 홍차, 캐러멜 내음이 뭉근하게 피
적립식 는 가운데, 고수 같은 향신료와 가죽·타르·마분지류의 매캐함이 뒤따랐다. 여기에 더해지는 말린 장미향이 고혹적이었다. 보통의 와인에선 잠깐이나마 스칠 법한 자두·체리 등 검붉은 ‘날것’의 내음 없이, 달이거나 말린 것들의 인상만 이어진 것이다. 입에선 당도가 절제된 채 예의 대추차와 계피류 향신료가 감칠맛을 자아냈다. 와인을 넘긴 뒤엔 꽃향과 캐러멜이 목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타고 올랐다.
품종이나 생산지는 오리무중이지만 한가지는 확실했다. 이 와인은 ‘올드 빈티지’, 즉 오래 묵었다.
와인에는 생물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 빚은 지 3년 이내 어린 레드와인은 잉크나 물감을 잔뜩 푼듯 검붉다. 향에선 대개 체리·딸기·자두 같은 생과실이 지배적이고, 탄닌(tannin·건조하고 떫은 느낌을 주
bifc 는 천연 폴리페놀)의 떫떠름함이 한창이다. 시간이 지나면 탄닌은 산소와 반응하거나 다른 폴리페놀과 결합하며 부드럽게 누그러진다. 직선적이던 과실향은 훈연, 향신료, 마른 과일, 낙엽 등이 덧씌이며 다채로워진다. 다만 숙성 잠재력을 넘어 과숙된 와인은 산화가 지나쳐 ‘식초’가 되고 만다.
나이 무색한 1964년산 바롤로의 ‘건강한 맛’
이날의 와인 역시 투명한 빛깔과 유려한 향, 달콤하게 녹아든 탄닌 등으로 미루어 수십년은 족히 되어 보였다. 필자는 ‘1980년대 빈티지의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피노 누아’라고 답을 불렀다. 그리고는 스승이 공개한 와인병을 몇번이고 다시 들여다봤다. 와인의 정체는 이탈리아 생산자 ‘피오 체사레’(Pio Cesare)의 바롤로(Barolo·품종은 네비올로). 빈티지(포도의 수확 연도)는 무려 1964년이었다.
피오 체사레 바롤로 1964년 빈티지. 천호성 기자
반세기가 넘도록 병 안에서 ‘살아있던’ 와인에 대한 경탄이 밀려왔다. 와인은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한 상태였다. 채 녹지 않은 탄닌이 혀에 얹혔고, 달달한 내음은 오랜 숙성에서 오는 쿰쿰함을 여전히 압도했다. 잔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꽃향까지 우세해지자 와인의 ‘환생’을 보는 듯한 경외감마저 들었다. “와인이 아직 한창이네.” 스승은 뿌듯하게 말했다.
프랑스 소테른 지역의 스위트 와인인 ‘샤토 드 파르그’(Château de Fargues) 1986년 빈티지. 스위트 와인은 대개의 와인에 견줘 장기간 숙성이 가능하다. 천호성 기자
와인이 ‘술 한병’ 이상으로 경이로운 이유
와인이 꼭 오래돼야만 맛이 드는 건 아니다. 사람의 생에서 어느 시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콕 집을 수 없듯, 와인도 생의 시점마다 나름의 멋을 낸다. 애호가는 취향이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마시고픈 연식의 와인을 열면 된다. 다만 긴 시간을 견딘 와인이 손꼽도록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건 분명하다. 세월만이 만들어내는 풍미가 있고, 이런 와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올드 빈티지의 행운을 누리는 날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 지구 반대편의 양지바른 포도원에서 영글었을 열매들을 떠올려본다. 그 알갱이를 정성껏 수확해 수십년을 버티는 술로 빚어낸 양조 장인의 손길도 그린다. 와인이 손상되지 않게끔 최적의 환경에 보관해온 상점들과, 눅눅해진 코르크를 솜씨좋게 개봉한 소믈리에를 향한 찬사도 빠질 수 없다. 와인은 한병의 술 이상으로 경이로워진다.
천호성의 천병까기는
먹고 마시기를 사랑하는 이라면 한번 쯤 눈독 들였을 ‘와인’의 세계. 7년 간 1000병 넘는 와인을 연 천호성 기자가 와인의 매력을 풀어낸다. 품종·산지 같은 기초 지식부터 와인을 더욱 맛있게 즐길 비기까지, 매번 한 병의 시음기를 곁들여 소개한다. 독자를 와인 세계에 푹 빠트리는 게 연재의 최종 목표.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 페이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소창에 아래 링크를 복사해 붙여넣어 읽을 수 있습니다.)
▶천호성의 천병까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3315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